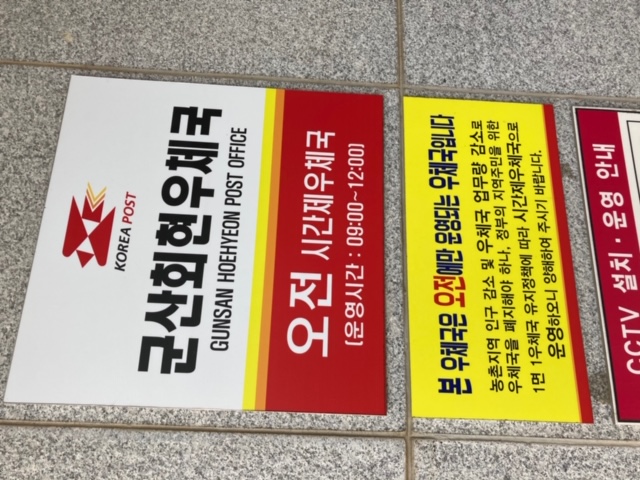전북 힙스터들의 성지, 군산엘 갔다.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다.
"너는 큰 나라에서 살다가 와서 그렇게 답답함을 느끼는 거야"
싱가폴에서 현지 친구가 내게 그렇게 말했다.
"난 한국인데?" 라고 했지만, 피식 웃으며
"싱가폴 봐라, 운전하고 가다가 과속하잖아? 그럼 바다에 빠져 죽어, 하도 작은 나라라 과속이 안돼"
말풍선이 있다면 내 머리위에 "반박불가"라고 띄워도 억울할 일은 없었다.
서울에서 한시간만 나가도 갑자기 주변이 바뀐다.
코로나로 온 가족이 함께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그의 엄마는 너랑 같이 살면 쌍방이 돌아버릴 것이다라며,
대학 휴학생 딸을 비어있는 익산의 친정집으로 보냈다.
혼자 짱박혀 있는 그 아해에게 오랜만에 밥이라도 사주려고 불러냈고,
그 아이는 군산 힙스터 성지들을 차근차근 안내해주었다.
그냥 무작정 걷던 길.
군산에서 산다하는 사람들도, 기차역도 예전의 도심을 모두 떠나 군산의 신도심으로 이동했고,
아직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 있고, 힙스터의 성지들이 모조리 그곳에 있었지만
한국판 디트로이트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도심은 앙상해졌다.
예단과 여성옷이 즐비한 시장을 지났다.
예전 미군에서 나온 물자를 떼다 팔았던 양키 시장이 나왔다.
양키 시장은 모두 남자 용품이었다.
"이 시장 공간은 참으로 젠더드gendered되어 있구나!'했더니
유배당한 그 아이는 깔깔대고 웃는다.
십대 이십대 애들이 웃는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경쾌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늙는 게 분명하다.
양키시장을 지나니, 밤에는 청소년들 출입을 금한다는 공간이 나왔다.
널찍한 유리판으로 된 문들이 주루룩 이어져 있는 걸 보니
지금은 모두 문을 닫았지만 예전에는 집창촌이었을 것 같았다.
역 앞에는 항상 있었던,
일제시대부터 시작하여 도시로 이주 나온
돈 없는 남자와 그보다 더 살기 힘들었던 여자들이 아마 이곳을 지났을 것이다.
지금은 누군가 한꺼번에 갖다 놓은 냉장고들이 뻘쭘하게 서 있다.
과거에는 교회인게 분명했을 것 같은 건물은
일층엔 노래 주점이 지하에는 베트남 노래방이 들어서 있다.
일제시대 만들어진 도시들의 구도심은,
지금은 급속도로 외국인 이주자들로 그 풍경이 바뀌고 있고,
월드푸드라고 써 있는 마트는 한자로 중국식품이라고 써 있었다.
"군산에서 먹었던 것 중에 니 돈으로 먹기엔 부담스러웠지만 정말 맛있는 걸 하나 말해봐"
니가 잘 하는 것은 무엇이니?
니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니?
니가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니?
라는 어른들의 상투적인 질문에 동기상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 탈산업 탈근대의 청춘은
먹는 거 묻는 질문에는 언제나 0.1초가 걸리지 않는다.
"떡갈비요"
우리는 그렇게 떡갈비를 먹었다.
하루를 묵고 변산으로 향했다.
왜라는 이유는 없고, 그냥 국립공원 사이트에서 그날 하루 빈 캐빈이 있어서 예약해서 갔을 뿐이다.
새만금을 지나는 길, 변산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면 되지만,
도로 안내판에 "무녀도"라는 게 보여서 오른쪽으로 꺾어 버렸다. 그 길의 끝에는 군산군도들로 선유도가 있다는 듯 하다.
선유도 가기 전이 무녀도였다.
김동리의 1936년작인 동명의 소설.
모화가 굿을 하며 바다로 한걸음씩 들어가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을 봤던
1997년 1월의 어느 새벽이 떠 올랐다.
읽고 나서 머리가 찡해 밖으로 나갔고, 춘천의 새벽 공기는 콧끝을 찡하게 만들었다.
김동리의 무녀도가 이 무녀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듯 했다.
적어도 안내 표지판 하나가 없는 걸 보면 말이다.
그 길의 끝을 따라가 보니 "박효신 수제 닭꼬치"라는 간판을 볼 수 있었고,
되돌아 변산으로 가는 길에 "야생화"를 틀었을 뿐이다.
숙소가 있는 모항으로 가는 길.
크로아티아에서 운전을 했던 길과 참 비슷하단 생각이 들었다.
차 문을 열고 스쳐지나가는 풍경들을 모두 내 눈알에 담고 뇌에 박아 버리겠다는 심산으로
찬찬히 더듬어 가는 길. 황동규의 <풍장>이 기억이 났다.
생각해보니, 군산에서 곰소라 했으니, 바로 이 길도 그 시의 어드메에 있는 게 맞았다.
내 세상 뜨면 풍장시켜다오.
섭섭하지 않게
옷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
손목에 달아놓고
아주 춥지는 않게
가죽가방에 넣어 전세 택시에 싣고
군산에 가서
검색이 심하면
곰소쯤에 가서
통통배에 옮겨 실어다오.
가방 속에서 다리 오그리고
그러나 편안히 누워 있다가
선유도 지나 통통 소리 지나
배가 육지에 허리 대는 기척에
잠시 정신을 잃고
가방 벗기우고 옷 벗기우고
무인도의 늦가을 차가운 햇빛 속에
구두와 양말도 벗기우고
손목시계 부서질 때
남몰래 시간을 떨어뜨리고
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툭툭 튀기는 씨들을
무연히 안 보이듯 바라보며
살을 말리게 해다오.
어금니에 박혀 녹스는 백금 조각도
바람 속에 빛나게 해다오.
바람을 이불처럼 덮고
화장(化粧)도 해탈(解脫)도 없이
이불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
마지막으로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바람과 놀게 해다오.
모항쪽에 다 다랐을 때에는 깜짝 놀랐으나 뭐에 놀란지는 도통 몰랐다.
분명 누군가는 시를 썼을 것 같았다.
숙소에 도착해서 찾아보니 안도현이 <모항으로 가는 길>이라는 시를 썼단다.
계속 시가 생각났는데, 이 동네가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하긴, 서정주도 이곳에서 그닥 멀지 않은 동네 사람이긴 했다.
짐을 풀고 나와 다시 그 길을 되돌아 채석강으로 갔다.
다른쪽에서 그 길을 가면 어떨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채석강 앞의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 조기 한마리 와 계란 완숙 후라이가 나오는
전북 표준 백반 하나를 받았다. 모두 베트남분들이 일을 하시는 듯 했다.
바다 건너 지는 해를 따라 가보니 그곳이 채석강이었고,
방파제쪽에는 게를 낚는 사람들이 사회적 낚시 거리를 두며 앉아 있었다.
아무데나 끼어 앉아 낚시 하는 아저씨 하나를 붙잡고 질문충 놀이를 했고,
다행히 아저씨는 설명충이어서 게 introductin to 게낚시를 충분히 듣고 왔다.
내게 낚시대 하나를 맡겼고 그렇게 해가 넘어 가는 걸 보면서 게를 낚아 올렸다.
아주 작은 게는 튀겨서 껍질째 먹는 맛이 꿀맛이라 했지만
까먹은 척, 그 게들은 다 바다로 다시 던졌다.
와이파이 하나 안잡히는 숙소.
태더링으로 이준익 감독의 <변산>을 보였다.
꼰대 아저씨의 꼰대 위로라는 평도 있지만,
내가 어느덧 꼰대가 되었는지 몰라도
위로는 모를 지언정, 시대신 랩을 읊고,
문장대신 영상으로 말하는 게 좋았다.
그냥 변산이라는 공간으로 낭창낭창하니 담백한 이청준 버전이랄까.
그렇게 변산의 하루도 보냈다.
서울로 돌아왔다.
성적 마감을 미친듯 하고 무작정 떠나버렸던 2박 3일의 시간.
잠깐 어딜 다녀왔지?라는 생각까지 들던 그 시간.
이동하는 내내 시와 소설만을 생각했던 그 시간.
서울로 돌아왔고, 긴급속보로는 한 남자가 사라졌단다.
한때는 매우 존경한 어른,
몇년전 한국에 왔을 때 그가 수장으로 있는 곳에서 잠시라도 최선을 다해 일을 했던 것은
그가 꿈꾸던 도시와 내가 꿈꾸던 도시가 조금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한쪽의 외로움, 한쪽의 비겁함. 그 둘을 짊어지고 그는 떠났다.
20대 초반. 친구와 나는 한국에서 괜찮은 남자로 늙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쌤플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리스트를 짜는 프로젝트를 했었다.
리스트는 정말 별 볼 게 없었는데,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 그는 한쪽에 있었던 게 분명하다.
그리고 이제는 아마 지워야 할 것 같다. 그도 그걸 원할 것이고 그도 동의할 것이다.
<모항으로 가는 길>
너, 문득 떠나고 싶을 때 있지?
마른 코딱지 같은 생활 따위 눈 딱 감고 떼어내고 말이야
비로소 여행이란,
인생의 쓴맛 본 자들이 떠나는 것이니까
세상이 우리를 내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스스로 세상을 한번쯤 내동댕이쳐 보는 거야
오른쪽 옆구리에 변산 앞바다를 끼고 모항에 가는 거야
부안읍에서 버스로 삼십 분쯤 달리면
객지밥 먹다가 석삼 년만에 제 집에 드는 한량처럼
거드럭거리는 바다가 보일 거야
먼데서 오신 것 같은데 통성명이나 하자고,
조용하고 깨끗한 방도 있다고,
바다는 너의 옷자락을 잡고 놓아주지 않을지도 모르지
그러면 대수롭지 않은 듯 한 마디 던지면 돼
모항에 가는 길이라고 말이야
모항을 아는 것은
변산의 똥구멍까지 속속들이 다 안다는 뜻이거든
모항 가는 길은 우리들 생이 그래왔듯이
구불구불하지, 이 길은 말하자면
좌편향과 우편향을 극복하는 길이기도 한데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드는 싸움에 나섰다가 지친 너는,
너는 비록 지쳤으나
승리하지 못했으나 그러나, 지지는 않았지
저 잘난 세상쯤이야 수평선 위에 하늘 한 폭으로 걸어두고
가는 길에 변산 해수욕장이나 채석강 쪽에서 잠시
바람 속에 마음을 말려도 좋을 거야
그러나 지체하지는 말아야 해
모항에 도착하기 전에 풍경에 취하는 것은
그야말로 촌스러우니까
조금만 더 가면 훌륭한 게 나올 거라는
믿기 싫지만, 그래도 던져버릴 수 없는 희망이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온 것처럼
모항도 그렇게 가는 거야
모항에 도착하면
바다를 껴안고 하룻밤 잘 수 있을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너는 물어오겠지
아니, 몸에다 마음을 비벼 넣어 섞는 그런 것을
꼭 누가 시시콜콜 가르쳐 줘야 아나?
걱정하지마, 모항이 보이는 길 위에 서기만 하면
이미 모항이 네 몸 속에 들어와 있을 테니까